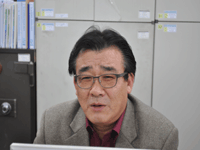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12~3년쯤 부대신문 직원칼럼에 글을 썼다. 그 때도 우리학교 학생들의 모습과 마음을 침이 말라라 칭찬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10년이 넘게 지켜보고, 부딪혀봤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면면은 변했을 지라도 그 맘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순수고 열정적인 모습은 그대로 이고, 이젠 나만 변하고 늙어가는 게 못내 아쉽고 우울하다. 그래서 나의 세월을 묶어 두고 싶고, 더 많은 학생들과 옷깃을 스치고 싶어 작년 연말에 학생과에 근무하기를 지원했다. 괜스레 멋쩍고 뭔가 들킨 것 같아 등에서 살짝 식은 땀이 한줄 흐른다.
그래도 좋다, 아니 좋을 수 밖에. 창밖은 웅장하면서 아늑한 직장 공간(캠퍼스)과 마주하고, 업무 대부분은 싱그럽고 착하기만 하는 학생들을 대하는 것이다. 일은 박진감이 넘치고 재밌다. 가는 세월이 무심하게 느껴질 때쯤, 나에게 한번 더 청춘을 맛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바로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해외봉사단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평소에도 학생들과 어울리기를 즐겨하던 나로서는 직장에서의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호흡을 하고, 땀을 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 할 맘으로 15박 16일의 긴 여정을 떠났다. 그러나 우리 봉사단원들은 내 뜻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늙지도 젊지도 않은 내가 앞에서 행동하는 게 불안한지 혹은 나를 생각해서인지 삽, 호미, 심지어 돌 하나라도 못 들게 한다. 우리들이 다 할테니 지켜만 봐 달라고 한다. 그건 사랑이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우리 해외봉사 단원들을 보고 난 이렇게 맘속으로 되뇌이게 했다. “아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리 사랑이고, 너희들이 하는 게 진짜 사람을 향한 사랑이구나.
마냥 철없어 보이고, 자기 생각만 주장해 가끔씩 얼굴을 붉힌 적이 있지만, 그건 과정일 뿐 결코 결과가 아니다. 이를 직접 보여준 해외봉사단의 아이들이 우리학교 학생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다시는 부산대 학생들을 향해 외칠 기회가 없겠지만, 항상 느끼고 향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조건없는 무한한 사랑을 보내며, 그들이 가는 길이 힘들 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대인(大人)같은 부대인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