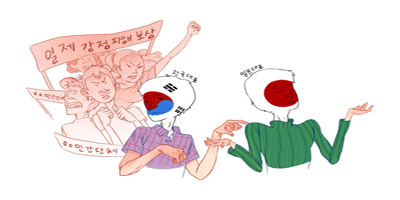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 중 당시 일본은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끌어들였다. 그 수가 1941년에 5만 명, 1942년에 11만 명, 1943년엔 12만 명에 이르렀고 여자정신대를 포함한 200만 명의 학도병까지 합산하면 수백만을 훌쩍 넘는다. 식민지 핍박을 피해 소련으로 이주해간 동포 숫자만 해도 25만 명이며 이중 상당수가 영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광복 이후 반세기 이상이 흘렀으나 식민지 경험으로 얻은 상처는 아물지 못했다. 징용령에 의한 강제노동 및 여자정신대 피해자 보상 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하송(재료공 4) 씨는 “일제강점기란 단순한 과거가 아니다”라며 “일본에 마땅히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민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는 정부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는 2005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지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강제동원으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 3백만원~2천만원의 위로금을 차등지급한다. 물론 위로금 지급은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증명 가능한 경우 이뤄진다. 지원위원회 이재철 팀장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된 강제동원 피해신고에서 12만 8천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의 범위는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직계 손자·손녀 등으로 한정돼 있다. 생존 피해자도 고령의 나이로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다. 또한 결혼 전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은 유족의 범위가 더욱 축소되며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70% 이상이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이재철 팀장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청산을 위해 움직이는 민간단체
현 정부가 피해 보상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 몇몇 민간단체들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일 과거사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는 한일 강제병합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지난달 일본 교토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정신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나눔의 집’ 박재홍 간사는 “일본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에 정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민간단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다”며 “일본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모습에 대해 권태억(서울대 국사) 교수는 “1965년 한일회담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3억 달러를 지급했다”며 “당시 일본은 그 돈으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워 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연구위원은 “강제징용 및 징발, 위안부 문제 등의 반인도적 문제는 국가 간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이는 국제법에도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민간단체들은 우리 정부에 기금 마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잘못을 시인하게 한 뒤 그들에게서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